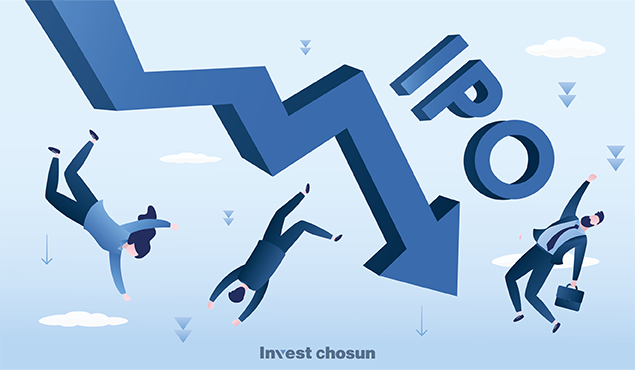주주간계약(SHA) 제동 등 상장 허들↑
-
악화된 증시 환경 속에 재무적 투자자(FI)를 주주로 맞은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하고 있다. 사모펀드(PEF)의 투자를 받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약속했지만 장이 꺾이자 LP(펀드출자자)와 한국거래소의 거센 압박 속에 놓인 탓이다.
공모가 하향 조정에 이어 철회까지 속출한 데 따라 상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알력 다툼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달 초 SK쉴더스와 태림페이퍼, 원스토어의 상장이 연거푸 철회한 데 따른 시장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철회를 결정하기까지 투자자들의 입김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SK쉴더스는 지난 2018년 맥쿼리PE를, 원스토어는 2019년 SKS PE, SK증권, 키움인베스트먼트 등을 FI로 맞았다. 태림페이퍼 역시 한 때 대형 사모펀드 IMM PE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현재는 세아상역이 100% 지분을 쥐고 있다.
원스토어가 마지막까지 상장을 강행했다가 결국 방향을 바꾼 데는 LP(유한책임조합원, 펀드 출자자)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는 전언이다.
원스토어는 SKS PE, SK증권, 키움인베스트먼트 등이 설립한 펀드가 지분 약 17.7%를 지닌 3대 주주다. SKS PE와 SK증권은 한 때 SK그룹 계열사였던 데다 원스토어가 투자한 중국 웹툰 플랫폼 콰이칸 투자자이기도 하다. 원스토어 상장 강행에 마지막까지 힘을 실었지만 결국 LP들의 강력한 항의에 두 손을 들었다는 전언이다.
SK쉴더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투자 받을 당시 약정했던 내부수익률(IRR) 약 6.5%를 갓 넘기는 수준으로 공모가를 합의했지만 이마저 수요가 부진했다. 결국 맥쿼리PE의 눈높이를 만족하지 못한 점이 상장 철회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FI로 불리는 사모펀드(PE)들도 결국은 공제회나 연기금 등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입장에 불과한데,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 출자 받기 어렵다”라며 “결국 LP들의 압박이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상장 일정이 남은 기업들 역시 사모펀드(PE)나 대형 VC(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곳들이 많다. 지난주 주관사 선정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친 11번가와 LG CNS는 각각 국민연금·새마을금고·H&Q코리아와 맥쿼리PE를 FI로 두고 있다. 두 회사 모두 투자 받을 당시 5년 내 IPO를 추진하며 각각 IRR(내부수익률) 3.5%, 4.5%를 보장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SK쉴더스와 원스토어 등 올해 상장이 좌절된 기업들도 다시 기회를 노려야 한다. 투자자들의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알맞은 기회에 상장 재추진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차례 상장 철회를 겪으며 가뜩이나 FI들과 의견 조율에 내홍을 겪었던 탓에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가가 높아지는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좋아한다”라며 “반대로 장이 조금만 꺾일 때는 공모가를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도 난리가 난다. LP들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변수로 인한 각종 악조건 속에 한층 까다로워진 거래소의 심사 기준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거래소가 FI 등 주주간계약(SHA) 내용을 여느 때보다 주의 깊게 살피고 있지만 발행사 역시 FI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거래소에서는 FI들의 권리를 제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사례가 대표적이다. 2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가 보유한 이사 임명권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 사전 동의권이나 투자 승인 등 주주들 간의 계약상 권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모양새다. 주주 명단에 FI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생긴 변화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장 실패에 대비해야 하는 FI들의 입장은 난감해졌다. 주주간계약 내용을 함부로 바꿨다가 자칫 상장이 엎어진다면 향후 엑시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결국 거래소와 FI들 사이에서 발행사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요즘 거래소에서 펀드들이 주주로 있는 기업들에 대해 2대 주주들의 동의권이나 상장 이후에도 잔존하는 주주간 계약상의 권리는 대부분 지워오라고 한다”라며 “다만 장이 꺾이며 상장이 언제 철회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상장 절차가 실패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다는 등 계약서 수정이 빈번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