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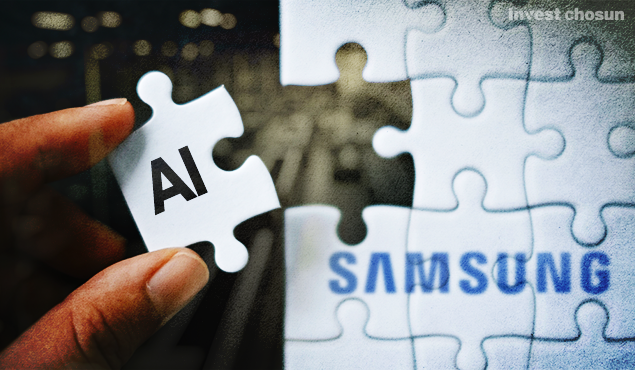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M&A) 거래를 슬슬 늘려가고 있다. 미국 B&W, 독일 플랙트그룹 인수에 이어 로보틱스나 공조(HVAC) 부문에서 후속 해외거래(크로스오버 딜)도 준비 중이다. 외국계 투자은행(IB)에 미국, 유럽 지역 내 잠재 매물을 추려 달라 요청한 만큼 1조원 안팎의 추가 M&A 성과를 순차로 선보일 전망이다.
8년 만에 M&A 시동이 걸렸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이 방향이 맞는가" 하는 물음은 여전하다. M&A 대부분이 구조조정 중인 글로벌 제조업체 인수 성격이 짙다. 해마다 10건 안팎 M&A를 치러온 글로벌 경쟁사 평균치에 비하면 여전히 시야가 좁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형적인 제조업체를 사들이는 건 그간 투자자들의 요구와도 동떨어져 있다.
삼성전자 M&A 성과 측정의 기준점은 글로벌 빅테크 진영
삼성전자는 14일 독일 HVAC 업체 플랙트그룹 지분 100%를 15억유로(원화 약 2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8조원에 하만인터내셔널을 인수한지 8년 만의 조 단위 M&A다. 단연 시장의 관심사는 이번 거래가 경영진이 수년째 공언한 '유의미한 M&A'냐 아니냐로 좁혀진다. 냉정하게 이번 거래를 평가하자면 실질적인 경쟁 상대, 글로벌 빅테크들이 즐비한 해외 무대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삼성전자의 경쟁사이자 협력사인 빅테크들은 해마다 꾸준히 5~10건 이상의 M&A를 치러왔다. 이중 보수적이라 분류되는 애플이 2017년 이후 치른 크고 작은 M&A만 50여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위기에 빠진 인텔도 13건의 M&A에 나섰다. 반독점 조사가 빈번하고 기업결합 문턱이 높아져도 M&A가 아니면 인재·기술 확보나 신사업 모색, 경쟁사 견제 등 전략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외국계 기관투자가는 "인텔까지 꺾은 삼성전자의 M&A 전략을 국내 기업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간 기관에서 M&A 부재를 문제 삼은 건 단순히 자산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시류에 뒤처지는 게 보였기 때문"이라며 "AI 같은 딥테크 시대에 들어와선 기술 이해도 외에 딜 노하우도 중요한데 나홀로 7년 넘게 쉬었으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원래부터 M&A에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자체 연구개발(R&D)이나 내재화 우선 전략을 고수해온 편이긴 하다. 이렇다 할 빅딜 없이 전 사업부가 글로벌 1위 타이틀을 거머쥐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핵심 기술 생태계 밖으로 밀려난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영진이 직접 유의미한 빅딜을 약속한지 수년이 흘렀다. D램 왕좌까지 내려놓은 터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위상에 부합하는 M&A를 수행하는지 곰곰이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모나 확장성 측면에서 아쉬움 나오는 '제조업' 중심 M&A
삼성전자가 최근 인수한 레인보우로보틱스, B&W, 플랙트는 각각 휴머노이드 로봇, 럭셔리 오디오, 냉난방공조 사업체들이다. 크게 보면 로보틱스와 전장,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로 다가올 트렌드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투자업계에선 규모가 너무 작거나 전통 제조업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 단위의 M&A가 있어도 주가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2년 전부터 삼성전자 리스트에 올랐던 월풀, 일렉트로룩스, 콘티넨탈과 존슨콘트롤즈 사업부 등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 자체 생태계를 확장하거나 단숨에 혁신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거래보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내놓는 매물로 보인다는 얘기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한해 매출액이 300조원인데, 웬만한 제조업체를 인수해선 외형 성장이나 기술, 인재 확보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만도 결국 전형적인 마진 확보형 사업부 중 하나가 됐을 뿐"이라며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와 너무 비교된다는 시각이 많다"라고 전했다.
M&A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조급함과 전사적 비용 통제 기조가 맞물려 안일한 선택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M&A 키맨으로는 여전히 안중현 경영지원실장 사장이 꼽힌다. 과거 미래전략실,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작년 경영지원실로 합류한 뒤 UBS 출신 임병일 부사장, 새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게 된 박순철 부사장 등과 함께 M&A를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당장 M&A 성과를 내자면 기술 이해도나 실제 사업화에 나서본 경험·역량을 요구하는 AI, 반도체 등 딥테크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선택지다. 대신 ▲한눈에 사업장이 들여다보이는 제조업 등 전형적 산업재 중에서 ▲최신 테마를 연결할 수 있고 ▲그나마 마진이 우수한 업체를 골라내는 건 비교적 수월한 선택지가 된다. M&A에서 수익성 등 성과지표를 우선시하면 기술이나 사업 이해도, 전략적 중요성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상대했던 자문업계 인사들은 "M&A 실무자나 재무라인을 상대할 때 '두자릿수 마진 아니면 제안서도 제출하지 마라'는 식의 응대를 받았다"라며 "삼성전자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당장 상부나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동은 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내수용 성과 그칠까 경계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M&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들도 적지 않다.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최근 M&A에 대해서도 지난 8년의 공백을 메워가기 위한 몸풀기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도 당장 수조원 규모 빅딜은 부담스럽지만 1조원 안팎의 거래를 꾸준히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연내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로보틱스 관련 소프트웨어(SW)나 HVAC, 바이오 등 추가 M&A가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반도체 담당 한 연구원은 "지금 성과로 업사이드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기조가 바뀐 게 중요하다. 큰손인 삼성전자가 M&A 시장에 복귀한 만큼 실적이 필요한 자문사들도 좋은 거래를 물색해줘야 할 유인이 커진 셈"이라며 "지금은 내수 홍보목적 거래에 그치지 않고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삼성전자가 달려주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