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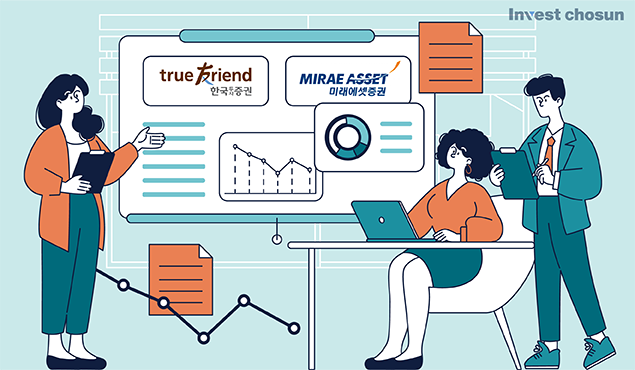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기업공개(IPO) 주관사 경쟁 판도가 바뀌고 있다. 한때 '빅3'(Big 3)로 시장을 주도하던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실리'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면서다. IPO는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반면 수수료 수익은 낮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실질 수익과 연계된 사업 부문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 틈을 타 대신증권을 비롯,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IPO 시장 영역 확장을 노리던 중견사들이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새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상장 기준 완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더해지며 당분간 IPO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이룰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초 IB부문 인력 전환 배치 작업을 진행했다. 삼성그룹 딜(Deal) 등 대기업 거래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영업역들을 커버리지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등 IPO 부서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IB 영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였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IPO 부서는 과거 50명대 중반이던 인력이 최근 30명대 중후반으로 줄었다. 회사 측 전보로 타 부서로 이동한 인력이 10여 명, 자발적 퇴사자도 7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효율화 조치라기보다는, IPO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IPO를 단순 딜 주관 조직이 아닌 PI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시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IPO는 영업ㆍ자문ㆍ투자자 컨택 역량이 모두 필요해 'IB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투입되는 인력의 질과 양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IPO 부문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집중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현재 IPO본부는 50명대 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5명이 퇴사했고, 충원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 자율성이 낮아지고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변화는 최근 전사적으로 자산관리(WM)에 집중하는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많다. 2020년 전후로 투자를 집행한 해외 IB 딜에서 잇따라 부실이 발견되며 IB부문의 리스크관리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엔 커버리지 부서에서 따 온 대기업 자금조달 딜을 심사부서에서 무산시키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커버리지 조직 약화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미래에셋은 한화에너지 IPO 주관사 선정전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 과거 미래에셋은 한화그룹 회사채 주관 물량의 17% 이상을 담당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지만, 최근 1~2년 사이엔 주관사 명단에서 이름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IPO 부문 역시 리그테이블용 외형 확대보다는 IB 전체 전략 내 조율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두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함께 IPO 시장의 '빅3'로 평가받던 하우스들이다. 이들이 수익성 위주로 IPO 영업 전략을 바꾸며 빈 자리를 중형 증권사들이 메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메리츠증권이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을 상근고문으로 영입하고, 기업금융본부 신설과 함께 외부 IB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투자증권 출신 송창하 본부장, 삼성증권·브레인자산운용 출신의 이경수 상무 등이 대표적이다.
메리츠는 부동산 중심의 수익 구조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종합 IB로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형사들은 단순 주관 실적뿐 아니라,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 기업금융 전반 역량 입증 등의 차원에서 IPO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IPO 시장 내 존재감 확대를 노리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반도체장비검사기업 에이앤아이의 상장 주관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전까진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를 맡고 있던 딜이다. 삼성증권은 케이뱅크 IPO 공동대표주관사단에 새로 합류하며 기세를 올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 진행된 6건의 IPO 딜 중 4건의 주관을 맡으며 실적을 쌓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IPO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평가한다. 수익성이 낮은 IPO를 줄이고, 실질 수익이 기대되는 PI나 구조화 금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단순히 IPO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 변화로 단정하긴 이르다"며 "현재 흐름은 각 증권사 CEO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일시적 조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다른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중형사들이 공격적으로 IPO 인력을 확보하면서 시장 판도는 재편되는 중이지만, 동시에 대형사의 선택은 매우 유연한 구조"라며 "리그테이블 중심의 IPO 경쟁은 줄었지만, 여전히 IPO는 증권사의 전략적 도구로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