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부진, 신사업 불확실성 속 부채부담 급증 공통점
회계상 부채 아니어도 사실상 차입…계속 활용 어려워
다음 카드 마땅찮아…사업 정상화 없인 위기 반복 우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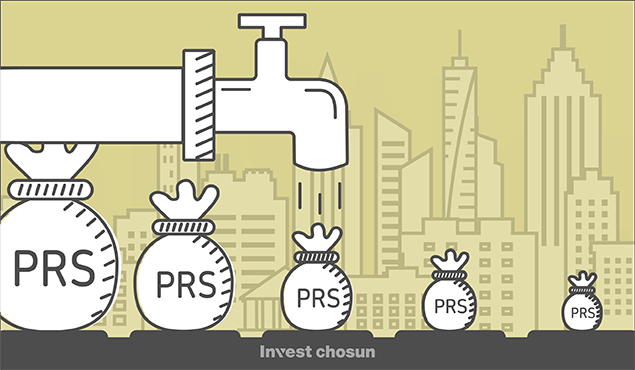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투자은행(IB)들은 연초부터 기업들에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할지를 두고 머리를 싸매왔다. 주력 사업은 꺾여가는데 신사업에 자꾸만 자금을 대야 하는 곳들이 적지 않았던 탓이다. 자산 매각부터 모회사 수혈까지 여러 방안이 오르내린 끝에 결국 주가수익스와프(PRS)가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급한 불은 잡혀가지만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안감이 여전하다. 위기가 거듭되면 다음엔 무엇으로 막아야 하는지 걱정도 일찌감치 오르내린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LG화학, 에코프로와의 PRS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으로 8000억원을, LG화학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주식으로 2조원 이상을 조달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각사 요구가 다소 무리하단 반응들이 나왔지만 모두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PRS는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을 매각에 가깝게 넘기되 만기에 가치 변동분을 정산하는 파생상품이다.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이자에 준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담보대출 성격이 짙지만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대부분 권리를 넘기는 구조라 부채로 잡히지는 않는다. 증권가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PRS를 찾는 기업들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이나 한화솔루션도 PRS를 활용해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자금을 융통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신주를 발행했고, 한화솔루션은 유렵 현지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활용했지만 실질은 LG화학이나 에코프로와 비슷하다는 평이다.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활용 가능한 주식을 박박 긁어 증권사 한도로 유동화하는 식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모회사 SK㈜가 지분율 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으니 신주를 활용(유상증자)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회사 주식에서 경영권 지분을 제하고 현금화에 나선 것"이라며 "어차피 회사 크레딧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과 비슷해서 기초자산이 무슨 주식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PRS를 택한 이들 기업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다. ▲유동성 호황기에 자회사를 상장시켜 신사업 마중물을 대려 했지만 ▲기존 주력 사업의 체력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신사업 수익성은 기대에 못 미치는데 ▲아직도 수조원의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회사 상장에 성공했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다 뿐 시장에선 이들 기업의 재무사정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4개 기업 모두 지난 3년여 동안 순차입금 규모가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불어났는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영구채나 메자닌 등 카드를 숱하게 활용해왔다는 점도 유사점으로 꼽힌다. 달리 보자면 추가로 영구채나 메자닌을 발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PRS로 숨통을 텄지만 앞으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온다. 몇 해나 사업 수완 이전에 재무적 처방만 되풀이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PRS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다음에 활용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도 있지만, 기존 사업의 정상화에도 적지 않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도 함께 거론된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그룹사들은 이미 알짜 자산 대부분을 매각, 유동화하기도 했고, 활용 가능한 주식 자산이 많아도 PRS를 계속 활용하기는 어렵다. 회계상 부채가 아닐 뿐 엄연히 빚에 가깝다"라며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다른 기업들은 석유화학 구조조정 이슈도 있다. 결국 각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면 또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수십조원을 투입한 신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그간 늘어난 부채를 줄여나가기까지는 불안감이 계속될 거란 시각이 많다. 태양광이나 2차전지 산업의 장래가 유망하기는 하나 언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각사 신사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둔 미중 갈등 한복판에 놓여 있는 점도 문제지만, 어떤 기술이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느냐를 두고도 전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