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바라는 FI, IPO 주도하기엔 지분율 낮아
RCPS 상환은 수익률 떨어져…결국 무신사 협조뿐
FI 반대로 사업 기회 놓친 무신사…내부 아쉬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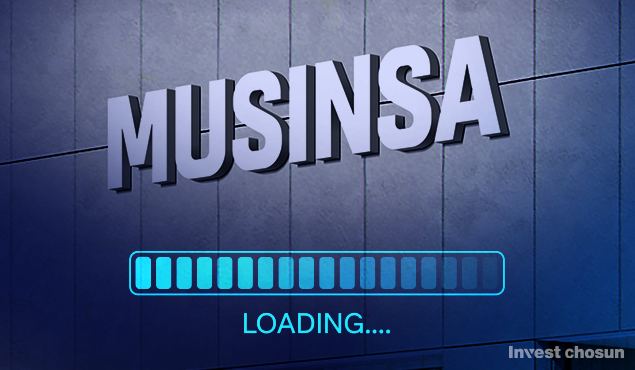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무신사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회사는 상장이 급하지 않은 반면 재무적투자자(FI)들은 빠른 회수를 바라고 있어 상장 단계마다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신사는 오랜만에 나온 상장 대어로 몸값이 10조원 이상 이를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주관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8월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됐는데, 지난달에야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선정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회사 측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주관사단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각 시리즈 FI의 주관사 선호도가 갈리며 이견을 조율하는 데 애를 먹었다. 주관 업무를 따기 위해 국내외 증권사들이 FI들을 찾기도 했다. FI의 희망과 회사의 선택도 다소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세 차례의 투자 라운드를 통해 총 4300억원을 조달했다. ▲2019년 시리즈 A 라운드에 홍산(전 세콰이어캐피탈의 중국 부문)이 약 1000억원 ▲2021년 시리즈 B 라운드에 IMM인베스트먼트와 홍산이 1300억원 ▲2023년 시리즈 C 라운드에 KKR과 웰링턴매니지먼트가 2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각각 인수했다.
주관사 선정이 지연되자 회사 측에서는 FI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영은 대주주가 하니 소수주주이자 조력자로서 역할에 집중해달라는 것이다. 주관사 결정권은 FI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협조 없이 상장은 어렵다. 이에 FI들은 주관사 선정 역시 회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주관사단 구성을 거의 조율한 단계로 알려졌다.
주관사 선정 문제가 일단락되며 출발 선상에 서게 됐지만 앞으로도 회사와 FI가 조율해야 할 쟁점은 많다. 우선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회사는 상장이 급하지 않은 반면 FI들은 IPO를 통한 조기 회수를 바라는 상황이다.
최근 무신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06억원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매출은 1조원에 근접해 2년 연속 연 매출 1조원 돌파가 확실하다. 이제 막 공략을 시작한 해외 패션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한 두 해 더 확인한 후 나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애초 무신사가 FI 자금을 유치한 것도 성장 자금이 급해서는 아니었다. 유동성 풍년과 플랫폼 투자 열풍에 힘입어 자금을 조달하긴 했지만 해당 자금으로 회사의 가치가 극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장이 예상보다 더딜 경우 FI들은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 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마다 8%나 10%의 보장 수익률을 얹더라도 장외 시가보다는 낮다 보니 실익이 크지 않다. 일부 FI는 장외 시장에서 보통주 구주도 일부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 회사에 우선주를 팔고 나면 이사회에서 빠진 상태에서 보통주 회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상장이 본격화하더라도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도 지난할 전망이다. FI가 얼마나 구주를 매출하고, 보호예수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회사 입장에선 구주 매출 규모를 줄이고 보호예수를 늘리는 것이 상장 흥행에 유리하다. FI가 보호예수를 최소화하려는 데 반대 의사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무신사와 FI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썩 우호적인 관계로 보긴 어렵다. 회사의 사업 성장에 FI가 크게 기여한 것은 없지만, 각종 거부권 때문에 아쉬운 사업 기회를 놓쳤다는 시각도 무신사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부문이 대표적이다.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의 부지를 인수해 사옥을 올렸지만 FI들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묶이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이에 무신사는 사옥을 팔고 재임차(세일앤리스백)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부동산 가치가 몇 배로 뛰며 아쉬움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무신사는 IPO가 급하지 않다는 게 변수"라며 "FI의 엑시트를 위해서는 무신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말했다.